– 평생교육 현장을 조금은 거리를 두고 이론적 시선으로 조망

평생교육 담론이 기존의 교육 담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했으므로 ‘평생교육’과 ‘교육’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흐름을 일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도 교육인 이상 기존의 교육 담론을 포괄하는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서 마치 교육이 아닌 것처럼 논의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만다. <평생교육론의 시선>은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고 논의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학교교육에 갇혀 있던 기존의 교육 담론을 기간과 장소의 제한 없어 언제 어디서나 진행하는 교육에 관한 담론으로 확장하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교육 담론으로 인해 분절적으로 인식된 교육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길을 열어간 담론이 평생교육 담론이다. <평생교육론의 시선>은 여기에 교육 담론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수준 차원의 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교육은 앎이나 능력의 수준 향상에 개입하는 고유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에 참여하는 당사자이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다. 교육의 주체성을 회복하려면 교수자와 학습자 각자의 활동 및 양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이를 세세하게 드러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 진행하는 교육의 전제와 함의도 풍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의를 토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수준에서든 진행하는 교육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은 시대가 호명한 개념이다. 무엇보다도 후자는 인권 신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은 현실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양태가 하나로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양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평생교육에 관한 담론은 관념적으로 흐를 수 있다. 문해교육도 시대가 호명한 개념이다. 그러나 기초교육의 맥락 속에서 평생의 시선을 놓치게 되면 문해교육 담론은 길을 잃을 수 있다. 방계학계로 인식하며 진행하는 학력보완교육도 분절적으로 다루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사회 역시 시대가 호명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반응이 일관될 수 없으며, 그래서 지역주민의 삶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평생학습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삶은 앞으로 학습동아리 활동과도 맞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활동은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다. 학교평생교육도 지역과 함께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의 모든 주민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역량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사회는 마을 단위에서는 평생학습마을이 되며, 이 마을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기초를 다지고 돌봄과 나눔을 일상화하고,생성의 관행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여기서 교육은 천천히, 꾸준히, 다 함께 진행하는 양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론의 시선>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어 평생교육 현장을 조금은 거리를 두고 이론적 시선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글와글]우리의 미래에 대해 함께 다시 상상하기: 교육을 위한 신사회계약](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스크린샷-2021-11-30-오후-6.12.38-360x180.png)

![[신간소개] 윤여각 지음(2021), 『평생교육론의 시선』 (서울 : 교육과학사)](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스크린샷-2021-11-30-오후-5.49.24-360x180.png)


![[와글와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은 우리 도시의 미래](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14bfc776bd99284bc81f7d72ac389321d9da3135_2_690x487-360x180.jpg)
![[와글와글] 전환의 시대, GNLC를 다시 생각한다](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스크린샷-2021-11-01-오후-5.05.22-360x180.png)

![[와글와글]문해력(리터러시), 어떻게 볼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는 무엇인가?](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09/munhae111-360x180.png)
![[대한민국평생학습도시] 16편,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 군산](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군산시2-360x180.png)
![[평생학습 프로그램 시리즈]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 ‘새로운 노인상(像), 신노인(新老人) 되기’](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5b26691a81737257f096f87a053d1ce0c3dda667_2_690x483-360x180.jpg)










![[신간소개] 윤여각 지음(2021), 『평생교육론의 시선』 (서울 : 교육과학사)](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스크린샷-2021-11-30-오후-5.49.24.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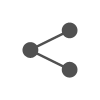
![[와글와글]우리의 미래에 대해 함께 다시 상상하기: 교육을 위한 신사회계약](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스크린샷-2021-11-30-오후-6.12.38-120x86.png)



![[와글와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은 우리 도시의 미래](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14bfc776bd99284bc81f7d72ac389321d9da3135_2_690x487-120x86.jpg)
![[와글와글] 전환의 시대, GNLC를 다시 생각한다](https://l-webzine.kr/wp-content/uploads/2021/11/스크린샷-2021-11-01-오후-5.05.22-120x86.png)
